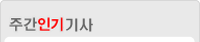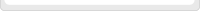현 정부 들어 여권 주류로부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관련해 전해들은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다.‘박 전 대표에게 힘이 실리면 그 순간부터 상당수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줄을 서 이명박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현상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박 전 대표가 차기 대권을 거머쥐면 친이명박계는 전멸할 가능성이 크다.’권력누수를 차단하고, 자신들이 살아남으려면 시쳇말로‘박 전 대표를 키워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이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 전 대표를 누르고 정권을 잡았음에도 공박증(恐朴症·박근혜에 대한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친이명박계 인사는 정권 초기 여권 내부에서 박 전 대표를 총리로 중용하는 방안이 한때 논의되다 ‘없던 일’로 돼버린 데에도 공박증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를 총리로 발탁하면 친박계가 득세하고, 정국 운영의 주체인 친이계가 와해되면서 레임덕 현상이 초래될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차기 대권후보 가운데 부동의 1위인 박 전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면 역대 총리와 달리 명실상부한 ‘실세 총리’가 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들의 판단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세종시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박 전 대표에게 결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여권 주류의 다짐이 읽힌다.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박 전 대표와 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나, 수정안을 내놓은 뒤 ‘원안 알파’를 고수하는 박 전 대표를 ‘과거지향적 인물’쯤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그 전면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운찬 총리, 청와대 참모들이 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느닷없는 ‘강도 논란’에서 나타나듯 박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의 반발 강도가 세지면서 여권 주류와의 간극이 너무 벌어졌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회동을 주선하겠다던 정 총리가 “대화를 주선할 힘이 없다”고 한 발 뺐을 정도다.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세종시에 관한 한나라당 당론이 과연 채택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박 전 대표의 권력의지 또한 여권 주류의 기대와 달리 더 강해졌다. 여권 주류가 박 전 대표와 날선 공방을 잇달아 벌임으로써 박 전 대표가 자연스럽게 정국의 중 심에 서게 된 것이다. 야당의 존재감마저 박 전 대표에게 가려졌다.
세종시 문제가 장기과제로 넘어갈 듯한 형국은 여권의 부담이다. 박 전 대표의 영향력이 약화되기는커녕 확대된 것은 여권 주류의 의도와 배치된다. 어떻게 해서든 박 전 대표에게 밀리지 않으려다 여권 주류가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여권 주류는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박 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차기 대선만을 의식한 정치공학에 갇혀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정치인 아니냐고.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여권 주류의 공박증이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때늦은 감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여권 주류가‘박근혜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바란다.‘박 전 대표가 잘 되면 친이계가 죽을 것’이라는 부정적 사고를,‘박 전 대표가 잘 되도록 도우면 상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수년 뒤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확실한 상황을 미리 염려해 같은 집안 식구인 박 전 대표와 티격태격하면서 얻은 게 무엇인가.
박 전 대표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가 ‘손잡으면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도록 상대에 대한 배려를 약속하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신뢰를 쌓아 가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 권력은 부자(父子) 간에도 나누지 못한다고 하나 시대가 변했다. 절대권력의 부패상을 목도하면서 권력은 나눠야 하는 시대가 된 점도 참고했으면 좋겠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다. 현 정권의 중간평가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6월 지방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시간이 별로 없다.
여의춘추 김진홍 논설위원 j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