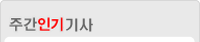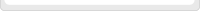한복협 9월 월례회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발제문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는 11일 금요일 오전7시 화평교회에서 "한국교회와 십자가의 길"이란 주제로 한복협 월례회를 가졌다. 다음은 최이우 목사(종교교회)의 발제문 전문.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는 11일 금요일 오전7시 화평교회에서 "한국교회와 십자가의 길"이란 주제로 한복협 월례회를 가졌다. 다음은 최이우 목사(종교교회)의 발제문 전문.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 예수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비아 돌로로사(Via Dolorous)”이다.“비탄의 길”“슬픔의 길”이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집무실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연결된 1.5km정도의 길이다. 빌라도로부터 사형언도를 받으신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이 씌워진 후 홍포를 입고 희롱을 당하시며, 군인들에게서 손바닥으로 맞았다.
십자가를 지고서 150m 정도 가시다가 그 무게와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길바닥에 첫 번째 쓰러지셨다. 겨우 일어나 20m쯤 더 가셨을 때 로마 군인은 이미 예수님 혼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갈 수 없음을 확인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리고 30m쯤 더 가시다가 두 번째 쓰러지셨다. 그리고 골고다 정상이 가까웠을 때 세 번째 다시 쓰러지셨다.
십자가는 예수님도 지시기에 너무 무거웠고, 그것을 지고 가기에는 너무 지처 있었다. 골고다 정상에 이르렀을 때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에 매어달린 그 고난의 절정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시며 마침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세상을 떠나셨다. 이 때 숨은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으로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그리스도의 시신을 고이 모셨다. 바로 여기까지가 십자가의 길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제목은 “감리교회의 목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감리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 같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니 그 길 어느 한 모퉁이에서도 영광을 받으신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는 고난과 슬픔으로 점철되어진 죽음의 길이다. 그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십자가의 길을 달리 말할 수 있을까?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를 배경으로 쓴 ‘헨리크 센케비치’의 “쿼바디스”의 한 장면을 다시 생각한다. 극심한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캠파니아 쪽을 향하여 아피안 국도를 걸어가는 두 명의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그들은 나자러스와 베드로였다. 순교하는 신자들을 버리고 베드로는 마침내 로마를 출발하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
드디어 아침 해가 언덕 위로 둥근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깜짝 놀랄 광경이 사도의 눈앞에 떠올라 왔다.····베드로는 갑ㅈ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너는 저 햇빛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이느냐?’ ·······
그는 갑자기 땅 위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쳐들며 외쳤다.
“오, 그리스도! 그리스도!”
마치 그는 사람의 발에 키스라도 하는 것처럼 땅에다가 머리를 처박았다. 오랫동안 침묵상태에 있다가 이윽고 사도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Quo Vadis, Domine(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자러스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질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의 귀에는 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무척 비통하게 들리기도 했다.
“그대가 나의 어린 양들을 배신했으니 나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센케비치가 탁월한 신앙적 감각으로 쓴 이야기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호운 목사님(1911-1969)이 쓰신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새 찬송가323장)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을 새롭게 다짐하게 된다. 3절의 가사이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데 한 때 이 가사의 일부분인 “제가 지고 가오리다.”를 “예수님이 지셨으니”라고 고쳐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더 이상 져야할 십자가는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처사이다.
모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 잊혀 지지 않고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대학입시지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낯선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학교사무실을 찾아왔다. 교회에 다닌 적도 없고 세례를 받지도 않은 아들을 신학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추천서를 서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교회를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아들을 신학대학에 보낼 생각을 하셨는지를 물었더니 “목사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대로 잘 사는 것 같아 아들을 목사 한 번 시켜보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목사뿐일까?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입례하기 전 목사가운을 입는데 내 마음 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이 우아하고 화려한 가운이 나에게 날개인가, 멍에인가?” 날개라는 의미는 가운을 입고 파이프오르간의 입례반주에 맞추어 화려한 성전의 강단에 올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강단에 오를 때까지 매번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영혼구원을 위한 산고(産苦)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양육을 위한 모성적 책임에 따르는 고통을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 멍에이다.
지금 이 때 감리교회 목사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교단의 최고지도자 선출과정에서 비롯된 아픔이다. 한 교회의 목회자의 길도 마땅히 십자가의 길이어야 하는데 하물며 160만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교단장의 길이 어찌 영광만이겠는가! 선한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임에 틀림없다. 언제 어디서 생각해도 십자가의 길은 ‘비아 돌로로사’ 이외의 길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누가복음9:23)
뉴스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