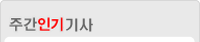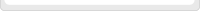꽃과 애경사

꽃은 처녀성(處女性)을 상징한다.
셰익스피어는 여주인공으로 하여금 순결이나 정조 같은 처녀성을 나타내게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꽃'으로 비유했다. 오필리아, 데스데모나, 코델리아, 마리나, 파디이타... 모두에게 이 '꽃'말을 쓰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처녀성을 유린한다는 것을 deflower라 하는 것도 이 상징성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기원이 되어 꽃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되었으며, 다시 이 풍습이 보편화되어 더불어 기뻐하고 더불어 슬퍼한다는 뜻의 주고받음을 꽃으로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남의 집에 초대받아 갈 때나 애경사(哀慶事)가 있을 때 꽃 한 송이만 들고 가면 그만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예로부터 꽃은 사랑의 상징이었다. 고려 충선왕(忠宣王)이 원(元)나라에서 돌아올 때 사랑하는 미희(美姬)에게 연꽃 한 송이를 꺾어주며 사랑의 불변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미희가 "꺾어주신 연꽃송이 처음에는 붉더니 얼마 안 가 시드는 것이 마치 사람과도 같아라"라는 시를 보내어 사랑의 변심을 역시 시드는 꽃으로 전달하고 있다. 옛날에 구애한다는 것을 속된말로 '투화(投花)'한다고 했다. 내외가 심했던 시절인지라 앵두꽃이나 복사꽃에 돌을 매달아 담너머 아가씨에게 던지는 것으로 구애했기에 생긴 말이다.'독립신문'을 보면 세검정에 사는 한 순검(巡檢)의 젊은 각시에게 투화를 했다가 곤장을 맞은 얼간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그 밖에 꽃을 주는 습속이 있었다면 세속을 등지고 살다 간 군자(君子)의 상여가 나갈 때 그 뜻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봄이면 매화꽃을, 가을이면 국화꽃을 꺾어다 그 상여에 꽂은 것이 고작일 것이다. 요즈음 애경사에 화환이며 꽃바구니며 2단, 3단으로 꾸민 화책(花柵)이며 한 길이 넘는 화초를 보내는 것은 전통적으로 뿌리가 없는 문화의 돌연변이인 것이다.
애경의 뜻은 한 송이 꽃이건 백송이 꽃이건 다를 것이 없을 텐데, 크고 많은 꽃일수록 보다 많이 애도하고 보다 많이 축하한다는 발상도 한국적이려니와 그렇게 보내고 받는 꽃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애경의 뜻이 증발하여 사라졌다는 사실에 둔감해져 있는 우리다.
보낸 사람은 꽃이나 화환에 써 붙인 이름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또 받은 사람은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이만큼 많은 꽃을 받았다는 것을 과시하며, 문상객들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꽃을 보냈는가로 상가의 신분을 확인하려 든다. 애경과는 거리가 먼 이 삼위일체가 화환문화를 마냥 가속시킨 것이다. 이름을 적어 매는 리본의 폭이 갈수록 커지고 금테까지 두르는가 하면 금박이 글씨로 쓰고, 심지어는 수까지 놓는 사치화가 이 화환문화의 저변에 깔린 불순성을 입증해주는 것이 된다. 꽃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고관(高官)들에게만 화환 보내는 데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제한, 한 송이 꽃에 참뜻을 담아가는 새 바람이 작풍(作風)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