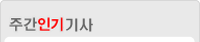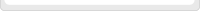2003년 1월 27일. 드디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 새벽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나는 어리둥절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한국 영사관으로 실려가던 승용차 안에서 깜박 졸면서 꾼 꿈이 그대로 현실화됐다는 게 신기했다. 꽃다발을 안기며 반가이 맞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대는 기자들…. 
우리는 대형 버스에 실려 어디론가로 갔다. 그간 중국에서 겪었던 3년여 동안의 처절했던 과정이 차창 밖으로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함께 오지 못한 동생들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이젠 영영 볼 수 없다 싶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무엇보다 그들이 나 때문에 배신자로 취급받을 일이 못 견디게 괴로웠다.
아직도 어둠이 걷히지 않은 한국의 차창 밖 풍경이 너무나 황홀했다. 그 중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빨갛게 불을 밝히고 있는 수많은 십자가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십자가가 얼마나 많나 하나 둘 세어보았다. 그러나 이내 무리라는 걸 알았다. 그야말로 온통 십자가 천지였다.
‘아, 이 나라는 십자가의 땅,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구나. 그래서 이 나라에 큰 축복이 내려졌구나.’ 독재자 우상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나라와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였음을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일정기간 당국의 조사를 받고 2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게 돼 있었다. 한 달 여 간의 조사를 마친 뒤 우리는 영락교회에서 드리는 합동예배에 참석했다. 중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며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마 대단할 거야’ 하는 기대도 했다. 역시 기대 이상이었다.
교회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성스러운 기운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성전 안으로 들어서니 그와는 딴판으로 웅장하고 위엄이 있는 가운데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다. 6·25전쟁 때 내려온 실향민 1세들이 지은 교회라는 데에도 각별한 의미를 느꼈다.
“여기 혹시 평양에서 온 사람 없소?”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자 웬 남자 한 사람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더니 불쑥 물었다.
“이 동무가 평양에서 왔습네다.”
옆의 예진 언니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바로“혹시 모래터에서 오지 않았소?”라고 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모래터’라면 호위사령부 청사를 지칭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곳과 관련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혹시 호위국 출신이세요?”
“난 호위국 장교였습니다.”
기뻐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다.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이렇게 호위국 출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다. 내가 호위사령부 협주단 배우였다는 걸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대부대 남숙 동지 배우지요?”
더욱 놀랐다. 탈북 이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던 나의 지난 추억 속의 그 시절을 상기시키는 그 사람이 반갑기 그지 없었다. 그 사람은 한국에 온지 5년이 지났으며 신학을 공부해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또 다시 놀랐다. 탈북자도 공부하면 목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리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업가? 아니면 연예인? 연예인이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았다.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끌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끌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롬 4: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