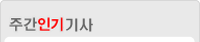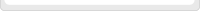мҳӨлһҳм „м—җ мқҪм—ҲлҚҳ мҳӨ н—ЁлҰ¬мқҳ "л§Ҳм§Җл§ү мһҺмғҲ"лқјкі н•ҳлҠ” лӢЁнҺё мҶҢм„Өмқҙ мғқк°ҒлӮ©лӢҲлӢӨ.
мһҳ м•Ңл Ө진 лӮҙмҡ©мқҙм§Җл§Ң к°„лһөн•ҳкІҢ мҶҢк°ңлҘј н•ҳл©ҙ, нҷ”к°Җ м§Җл§қмғқ мҶҢл…Җ мҲҳмҷҖ мЎҙмӢңлҠ” мҳҲмҲ к°Җ л§Ҳмқ„мқё лүҙмҡ• к·ёлҰ¬лӢҲм№ҳ л№ҢлҰ¬м§Җм—җм„ң кіөлҸҷмғқнҷңмқ„ н•ҳкі мһҲм—ҲлҠ”лҚ° лӘёмқҙ м•Ҫн•ң мЎҙмӢңлҠ” нҸҗл ҙм—җ кұёлҰ¬кі кі§ мЈҪмқ„ кұ°лқјлҠ” л¶Җм •м Ғмқё мғқк°Ғмқ„ н•ҳкІҢ лҗ©лӢҲлӢӨ. мҲҳлҠ” мЎҙмӢңм—җкІҢ лҒҠмһ„м—ҶлҠ” кІ©л ӨлЎң мҡ©кё°лҘј мЈјм§Җл§Ң мЎҙмӢңмқҳ л¶Җм •м Ғмқё л§җ л•Ңл¬ём—җ мһҗкҫёл§Ң нһҳл“Өм–ҙн•©лӢҲлӢӨ.
мЎҙмӢңлҠ” м°Ҫл¬ё л°–м—җм„ң ліҙмқҙлҠ” лӢҙмҹҒмқҙ мһҺмқ„ мһҗмӢ кіј лҸҷмқјмӢңн•ҳл©ҙм„ң лӢҙмҹҒмқҙ мһҺл“Өмқҙ лӢӨ л–Ём–ҙм§Җл©ҙ мһҗкё°лҸ„ мЈҪмқ„ кұ°лқјлҠ” лӘ№м“ё мғқк°Ғмқ„ н•©лӢҲлӢӨ. мҲҳк°Җ мқҙмӣғ집 лІ м–ҙлЁј мҳҒк°җм—җкІҢ мЎҙмӢңм—җ лҢҖн•ң мқҙм•јкё°лҘј н•ҳмһҗ лІ м–ҙлЁј мҳҒк°җмқҖ мқҙлӮҙ лҲҲл¬јмқ„ мҸҹмңјл©° "м„ёмғҒмІңм§Җм—җ к·ёлҹ° л°”ліҙ к°ҷмқҖ мҶҢлҰ¬к°Җ м–ҙл””мһҲлғҗ"л©° л…ёл°ңлҢҖл°ңн•ҳкі , мЎҙмӢңк°Җ лі‘ л•Ңл¬ём—җ л§ҲмқҢмқҙ м•Ҫн•ҙ진 кұ°лқјл©° мҲҳм—җкІҢ к·ёл…ҖлҘј мһҳ ліҙмӮҙн”јлқјкі лҸ…л Өн•©лӢҲлӢӨ.
к·ёлӮ л°Ө нҸӯн’Қмҡ°к°Җ л§Өм„ӯкІҢ лӘ°м•„м№ңлӢӨ. мЎҙмӢңлҠ” мҳҶ집 лӢҙмҹҒмқҙ лҚ©көҙмқ„ ліҙлҠ”лҚ° лӮҳлӯҮмһҺл“Өмқҙ лӢӨ л–Ём–ҙмЎҢм§Җл§Ң л§Ҳм§Җл§ү мһҺмғҲ н•ҳлӮҳлҠ” лҒқк№Ңм§Җ л–Ём–ҙм§Җм§Җ м•ҠлҠ” лӘЁмҠөмқ„ ліҙл©ҙм„ң мЎҙмӢңлҠ” к·ё лӮҳлӯҮмһҺм—җ к°җнҷ”лҗҳм–ҙ мӮ¶м—җ лҢҖн•ң мқҳм§ҖлҘј м–»кІҢ лҗҳм§Җмҡ”. к·ё л’Ө мЎҙмӢңк°Җ мҷ„м „нһҲ нҡҢліөлҗҳмһҗ мҲҳлҠ” лІ м–ҙлЁј мҳҒк°җмқҙ м Ҳл§қм—җ л№ м§„ мЎҙмӢңм—җкІҢ нқ¬л§қмқ„ мЈјкё° мң„н•ҙ л°ӨмғҲлҸ„лЎқ нҸӯн’Қмҡ°лҘј л§һмңјл©° лІҪм—җ лӢҙмҹҒмқҙ мһҺ лІҪнҷ”лҘј к·ёлҰ¬лӢӨк°Җ нҸҗл ҙм—җ кұёл Ө м„ёмғҒмқ„ л– лӮ¬лӢӨлҠ” мқҙм•јкё°лҘј м „н•ҳл©°, нҢ”л ҲнҠём—җ л…№мғү, л…ёлһҖмғү л¬јк°җмқҙ лӮЁм•„мһҲм—ҲлӢӨкі л§җн•©лӢҲлӢӨ.
비лЎқ мҳӨлһҳм „ 쓰여진 мҶҢм„Өк°Җмқҳ мһ‘н’ҲмҶҚм—җ л“ұмһҘн•ҳлҠ” мқҙм•јкё°мқҙкё°лҠ” н•ҳм§Җл§Ң мҳӨлҠҳлӮ мқҳ мҡ°лҰ¬л“Өм—җкІҢлҸ„ л§ҺмқҖ к°җлҸҷмқ„ мӨҚлӢҲлӢӨ. л¬ҙм—ҮліҙлӢӨлҸ„ нқ¬л§қмқ„ мһғкі мЈҪмқҢмқ„ мғқк°Ғн•ҳлҠ” н•ң мҶҢл…Җм—җкІҢ нқ¬л§қмқ„ мЈјкё°мң„н•ҙ мһҗкё°к°Җ н• мҲҳ мһҲлҠ” мөңм„ мқҳ л…ёл Ҙмқ„ кё°мҡ°лҰ¬лҠ” л…ёнҷ”к°Җмқҳ лӘЁмҠөмқҖ к°җлҸҷмқ„ л„ҳм–ҙ м„ұмҠӨлҹҪкІҢ ліҙмқҙкё°к№Ңм§Җ н•©лӢҲлӢӨ. лҠҰк°Җмқ„ лӮҳл¬ҙлҒқм—җ л§ӨлӢ¬лҰ° л§Ҳм§Җл§ү лӢЁн’ҚмһҺмқ„ л°”лқјліҙл©ҙм„ң мқҙ мӢңлҢҖм—җ кјӯ н•„мҡ”н•ң мӮ¬лһҢмқҖ м–ҙл–Ө мӮ¬лһҢмқјк№ҢлҘј лӢӨмӢң н•ңлІҲ лҗҳмғҲкІЁ лҙ…лӢҲлӢӨ.